지난 주(6월 17일) 선생님과의 수행 인터뷰 중,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
[나] “선생님, 요기들이 말하는 삼매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매는 같은 것입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대화로 시작해, 선생님께서는 요기들의 견해와 부처님 가르침의 차이점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주셨다.
[선생님] “사문들은 니르바나(涅槃)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수행의 목적은 브라흐마(梵天), 즉 신과의 합일입니다. 그들은 형성된 것들(유위법)의 반대편에 있는 열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브라흐마와의 합일을 윤회의 종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브라흐마로 재생하더라도 윤회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다시 다른 존재로 윤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브라흐마로의 재생이 수행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요기들은 아트만(我, ātman)을 말하고, 부처님께서는 아나트만(無我, anātman), 즉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윤회를 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트만(我)이 있다고 해도 됩니다. 전생의 당신과 현생의 당신의 동일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아트만(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바로 업입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아트만(我)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철저하게 무아를 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에 이어진 말씀(아트만이 있다고 해도 좋지만 그 정체가 업이라는 것)을 듣고 오해가 풀렸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윤회에는 고정된 주체가 없다. 다만 업의 작용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현상의 흐름이 한 생이 끊어져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윤회를 통해 모습이 달라지는 중에도 그 삶들 간의 동일성의 근거를 아트만(我)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 본질은 바로 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아트만(我)을 인정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 다만 아트만을 영원불멸하는 실체라고 보는 요기들(또는 사문, 바라문, 힌두교도들)의 견해와 업의 작용을 개념화한 말로서의 아트만(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이렇게 보면, 디가 니까야에서(정확히 어느 경전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윤회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 –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갔다가 저 동네에 가는 것처럼” – 도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아트만(我)이 있다고 해도 된다. 그것은 윤회하는 어떤 중생이 윤회하는 다른 중생과 구분되는 근거가 되고, 한 중생의 전생, 현생, 내생의 연결적 동일성의 근거가 된다. 다만 그것은 업이 작용하는 모습을 명사형인 한 단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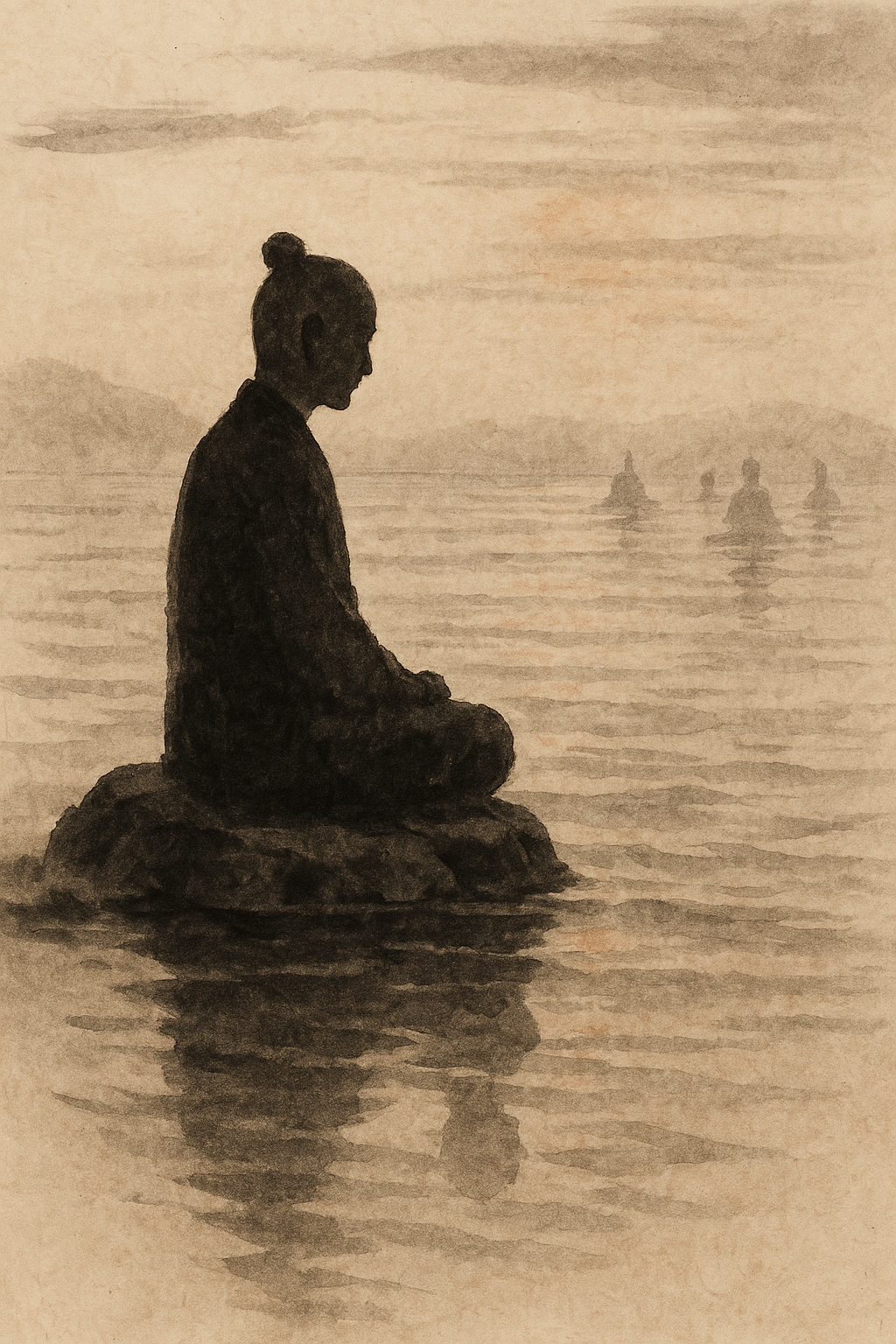
답글 남기기